
미국에서 데이팅 앱을 사용한 건 5년 전부터다.
Tinder, Bumble, Hinge, Coffee Meets Bagel... 나도 무수히 스와이프를 했고, 채팅을 했고, 때론 만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미국 데이팅 앱의 역사는 꽤 흥미롭다.
초창기엔 PC 웹 기반의 Match.com이나 eHarmony 같은 진지한 관계를 추구하는 사이트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2012년, Tinder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 몇 장, 간단한 자기소개만으로 만남이 가능해졌고, 연애는 '게임화(gamification)'되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는 동작 하나에 호감과 거절이 담겼고, 심리적 거리감이 희미해지면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진정성은 낮아졌다.
수많은 연구와 사용자 경험을 보면 데이팅 앱에서는 인종별 선호도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아시아계 남성은 미국 데이팅 시장에서 가장 낮은 매칭률을 기록한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OkCupid가 수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여성 사용자들이 아시아계 남성을 더 적게 선택하고, 메시지 응답률도 낮다.
나 역시 수많은 'Left Swipe(거절)' 속에서 살아왔다.
프로필을 아무리 가다듬어도, 사진을 바꾸고 글을 고쳐 써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앱은 단 한 명과도 매칭되지 않은 채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반면, 백인 친구들은 하루에 수십 명과 매칭되고, 만나고, 데이트하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앱 속에서 우리는 너무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물론 모든 앱이 똑같진 않다. 예를 들어 Coffee Meets Bagel이나 Hinge 같은 앱은 비교적 성향 중심, 대화 중심 매칭을 시도하며 아시아계 남성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실제로 나는 Hinge에서 만나 1년 넘게 교제한 여성도 있었고, 몇 번의 진지한 관계로 발전할 뻔한 적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짧게 끝났다. 앱의 구조 탓인지, 우리의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타이밍'의 문제였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데이팅 앱이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법적 문제와 상업적 부작용도 함께 커졌다. 허위 프로필, 스캠(사기), 개인정보 유출, 유료 결제 유도, 중독성 문제, AI 챗봇을 통한 감정 조작 등 앱 하나가 만들어낸 사회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매치그룹(Match Group)이 Tinder, Hinge, OKCupid 등 다수 앱을 소유하며 독점적 지위를 가져간 것도 한편으론 시장 다양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미국 내 데이팅 앱 사용자 수는 최근 2~3년 사이에 정체 혹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Z세대는 이 '스와이프 문화'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진짜 관계는 오프라인에서 찾겠다"는 흐름도 늘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에선 '데이팅 앱 그만두기 챌린지', '데이트 앱 디톡스' 같은 운동도 보인다. 나 또한 한동안 앱을 삭제하고, 직접 사람을 만나보자는 생각에 커뮤니티 활동, 스터디 그룹, 스포츠 모임 등에 나가본 적도 있다.
결국 내가 느끼는 건 이것이다. 데이팅 앱은 연애의 가능성을 넓혀준 동시에, 관계의 가치를 낮췄다.
스와이프 몇 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이상형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조금만 안 맞아도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된다.
선택지는 많지만, 진짜 만남은 줄어든다.... 결국 나는 내 삶의 진정성과 매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앱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진짜 만남을 원한다.


 파리바르바
파리바르바
 옥수수다방
옥수수다방
 215JEN
215JEN





 대박전자제품 CNET |
대박전자제품 CNET | 
 신바람 이박사 블로그 |
신바람 이박사 블로그 | 
 뉴저지에 살리라 blog |
뉴저지에 살리라 blo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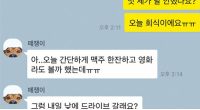
 패스트앤큐리어스 BLOG |
패스트앤큐리어스 BLOG | 
 영화를 사랑하는 돌리돌이 |
영화를 사랑하는 돌리돌이 | 
 Good Karma |
Good Karma | 
 낙지짬뽕 스핀 킬러 |
낙지짬뽕 스핀 킬러 | 
 LP Partners |
LP Partners | 
 Golden Knights |
Golden Knights | 
 방방곡곡 영스타운 |
방방곡곡 영스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