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버트 레드포드가 2025년 9월 16일, 유타의 선댄스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잠든 채 향년 89세로 사망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레드포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시작해 스팅으로 전성기를 달렸고, 보통 사람들로 감독으로서의 눈을 증명했으며, 선댄스로 다음 세대의 무대를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가끔 일요일 오후에 커피 한 잔 내려놓고 팝콘 만들어서 블루레이 소장중인 옛날 영화를 돌려보게 됩니다. 그중 유독 자주 다시 보는 게 로버트 레드포드의 스팅이에요.
1930년대 대공황일때 시카고가 배경이라 그런지, 시카고에서 살다 지나치는 동네에 영화 속 장난기와 긴장감이 어딘가에 아직도 남아 있는 듯합니다.
스캇 조플린의 더 엔터테이너가 귓가에 흐르면, 저도 모르게 발끝이 리듬을 타죠. 그 음악과 함께 레드포드가 짓던 장난스러운 미소, 그게 이 도시의 빈티지한 공기랑 꽤 잘 어울립니다.
레드포드를 처음 '아, 이 사람 다르다' 하고 느끼게 만든 건 사실 스팅보다 앞선 1969년의 내일을 향해 쏴라였습니다. 폴 뉴먼과 짝을 이룬 서부극인데, 전형적인 카우보이 영웅이라기보단 시대의 변두리에서 약간 비스듬히 서 있는 청춘들이었어요.
그때부터 레드포드는 뉴 할리우드의 공기를 얼굴로 설명하는 배우였습니다. 잘생겼지만 그저 잘생긴 게 아니라, 반항기와 순수함이 한 얼굴에 같이 사는 느낌. 말하자면 미국식 미남의 '정직한 표정'에 미묘한 그림자를 얹는 법을 아는 배우였죠.
그리고 1973년 스팅. 이 작품으로 레드포드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커리어는 완전히 날개를 달았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제 입장에선 이 영화가 더 각별해요.

사기극을 이렇게 우아하게, 또 이렇게 도시적으로 찍을 수 있나 싶거든요.
속이면서도 미워하기 어렵고, 놀라게 하면서도 관객을 존중하는 쇼맨십. 레드포드는 장난을 치다가도 눈빛 하나로 '이건 진심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속임수의 한가운데서도 이상하게 인간적인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 미묘한 균형이 그를 단순 스타가 아니라 '시대의 얼굴'로 만들었죠.
연기 폭도 넓었습니다. 서부극, 멜로, 스릴러, 액션을 넘나들면서도 캐릭터마다 다른 온도를 만들었어요. 기자 정신의 집요함을 보여준 대부 같은 작품들도 있었고, 낭만과 환멸이 뒤섞인 도시적 캐릭터에도 능했습니다.
그런데 레드포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1980년에 감독으로 데뷔해서 보통 사람들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가져갑니다. 한 가족의 균열을 만지는 방식이 참 섬세했어요. 시카고 북쪽 호숫가 쪽의 차갑고 고요한 공기가 영화의 정서와 묘하게 닮아 있었고, 그 절제 덕분에 인물들의 상처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배우의 얼굴로 시대를 비추던 사람이, 감독의 시선으로 마음의 골을 비춘 셈이죠.
그의 행보는 화면 밖에서도 이어집니다. 환경 보호와 평화 운동에 꾸준히 목소리를 냈고, 프랑스의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기도 했죠. 2012년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글을 국제 환경 블로그에 올리며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걸 '이미지 관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레드포드는 스무 살 청춘의 반항심을 일흔에도 잃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멋있는 말보다 꾸준한 선택이 더 설득력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늘 정의롭고 반듯한 역할을 주로 하던 그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에서 알렉산더 피어스라는 악역을 맡았을 때, 저는 솔직히 박수쳤습니다. 손주들에게 마블 영화 속 할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유쾌한 이유도 좋았고, 무엇보다 자기 이미지를 과감하게 뒤집는 그 용기가 근사했거든요.
코믹스 속에서 캡틴의 맨얼굴을 보고 누가 "저거 로버트 레드포드 아냐?" 중얼거린다는 일화도 있는데, 그만큼 그는 미국적 영웅 이미지의 한 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얼굴이 악역의 껍질을 쓰고 나타날 때, 관객은 묘한 배신감과 짜릿함을 동시에 맛보게 되죠. 그게 배우의 힘입니다.
레드포드를 이야기하며 선댄스 영화제를 빼면 섭섭합니다. 그는 독립영화 생태계의 토양을 직접 일군 사람이거든요. 자본과 스타 파워가 몰리는 할리우드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2018년, 미스터 스마일을 끝으로 그는 배우 은퇴를 선언합니다. 스스로 커튼을 내리는 우아한 인사였죠. 그 영화는 레드포드가 평생 탐구해 온 매력에 대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 든 신사에게도 마지막 한 번의 모험은 필요하다는 듯, 영화는 부드러운 미소로 문을 닫습니다. 저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괜히 조용히 일어나 고개를 한 번 끄덕였어요. 잘 놀았다고, 고맙다고.
돌이켜보면 레드포드가 우리에게 남긴 건 '선함'의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라, 선함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속고 속이는 사기극에서도 인간적인 신뢰를 잃지 않으려 하고, 가족의 상처를 들여다보면서도 절망에 가라앉지 않으려는 태도, 그리고 화면 밖에서 사회에 대해 책임 있게 발언하려는 용기까지. 쿡카운티의 평범한 아저씨인 저한테 그건 꽤 현실적인 영감이에요.
회사에서 꼬인 일 풀 때도, 아이들한테 설명하기 곤란한 뉴스를 마주할 때도, 이 사람의 태도가 떠오릅니다. 요령과 잔재주가 아니라 품위와 끈기로 문제를 푸는 법이요.
그래서 여전히 스팅을 자주 틉니다. 루프를 걸어 나와 밀레니엄 파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저 멀리 보드 오브 트레이드 빌딩의 굳센 선들이 영화 속 30년대와 은근히 겹쳐 보여요.


 옥다방고양이
옥다방고양이
 뿡뿡이집사
뿡뿡이집사



 Life in the US |
Life in the US | 

 시카고니언 Chicagonian |
시카고니언 Chicagonia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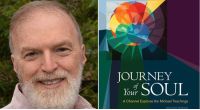
 일리노이 박성수 블로그 |
일리노이 박성수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