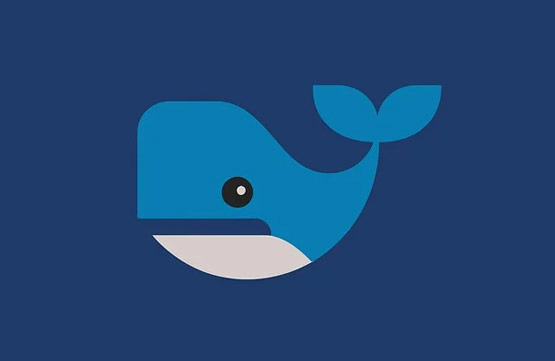
나는 다섯 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요즘 내 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들의 포경수술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지만, 주변에서 "언제 포경수술 시킬 거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진다.
미국에서는 과거에 비해 포경수술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970~80년대만 해도 신생아의 약 80% 이상이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포경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계에서도 포경수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리며, 전체적인 시행률은 60% 아래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중서부나 남부에서는 여전히 많이 시행되지만, 서부나 동북부에서는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부모들도 많다.
특히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가족 중에는 더 이상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선택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료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술 자체를 선택사항으로 두는 병원도 많다. 하지만 아시아계, 특히 한국이나 필리핀 출신 부모들은 한국적 정서를 반영해 여전히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에서 태어날 때 자동으로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는 '자동'이 아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 병원 측에서는 포경수술 여부를 부모에게 먼저 묻는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행하지 않고, 출생 직후 며칠 안에 수술을 원할 경우, 별도의 consent form(동의서)을 작성해야 한다. 나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가 조용히 와서 물어봤던 기억이 난다. 당시엔 "나중에 필요하면 하지 뭐"라는 생각으로 거절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이 조금은 찜찜하게 남는다.
내가 자라온 한국에서는 포경수술은 거의 필수였다.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 방학마다 남자애들 줄줄이 병원에 끌려가던 그 풍경, 수술 후 절뚝거리며 다니던 기억, '안 하면 이상하다'는 분위기. 그게 한국에서의 통념이었고,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통과의례처럼 여겨졌다.
그런데 미국에서 아들을 키우다 보니 시선이 달라진다. 여긴 '자연스러움'을 중시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학교에서든 체육관 샤워실에서든, 포경 여부를 들여다보며 차별하거나 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통증, 감각 저하에 대한 경고가 더 많이 들려온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생적인 측면, 사회적 비교(특히 또래 친구들이 대부분 수술한 경우), 또는 나중에 군대나 한국을 방문할 때의 문화적 충돌을 생각하면, '그래도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적 정서를 완전히 떨쳐내기도 쉽지 않다. 부모로서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나중에 아이가 불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더 이상 '당연한 수술'은 아니다. 부모가 충분히 고민하고, 의료적 설명을 듣고, 문화와 정서를 고려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다.
나는 지금 아이의 소아과 주치의에게 다시 한번 상담을 요청해볼 생각이다. 수술의 장단점, 나이에 따른 회복 속도, 감염이나 위생 문제 등을 실제로 따져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자기 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때, 그와 대화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부모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아이의 몸이다. 누군가를 따라가듯 결정하지 않고, 우리 가족만의 기준과 가치로 정리해보고 싶다.


 짱구는목말러
짱구는목말러
 그레이전화
그레이전화







 마스크를 쓴 미국남자 |
마스크를 쓴 미국남자 | 
 미국 지역 정보 로컬 뉴스 |
미국 지역 정보 로컬 뉴스 | 
 투자정보 뉴스 업데이트 |
투자정보 뉴스 업데이트 | 
 미국 부동산 정보의 모든것 |
미국 부동산 정보의 모든것 | 
 낙지짬뽕 스핀 킬러 |
낙지짬뽕 스핀 킬러 | 
 내나 이럴줄 알았다 |
내나 이럴줄 알았다 |  NO CAP LIFE |
NO CAP LIF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