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릴 땐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좀 무서워했다.
까칠해 보이고, 정에 안 붙을 것 같고, 언제 나를 긁을지 몰라 늘 거리를 두던 동물이 바로 고양이였다.
나에게 동물이라 하면 강아지가 원픽이었고, 고양이는 뭔가 도도하고 쌀쌀맞은 정이 안가는 느낌이었다.
그런 내가, 지금은 고양이 집사 3년 차. 샌디에이고의 햇살 좋은 원베드 아파트에서 나와 내 고양이 '루루'는 거의 룸메이트처럼 함께 살고 있다.
루루를 처음 데려온 건 27살 겨울이었다. 그때 난 막 이사해서 혼자 사는 게 처음이었고, 그 고요함이 생각보다 꽤 묵직하게 느껴지던 시기였다. 평소처럼 인스타를 보다가, 지역 동물 보호소에서 올린 루루의 입양 공고를 보게 됐다. 작은 회색 털에 노란 눈, 옆으로 삐죽 나온 수염, 그리고 딱 '나 심심해'라는 표정을 짓고 있던 루루. 이상하게 눈이 갔다. 충동적으로 보호소에 연락했고, 그렇게 루루는 내 인생에 들어왔다.
사실 처음 한 달은 '이게 맞는 선택이었나' 싶기도 했다. 루루는 낯을 많이 가리고, 내가 다가가면 후다닥 숨곤 했다. 기대했던 '고양이가 무릎 위에 올라와 자고, 같이 드라마 보는 행복한 밤'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루루는 서서히 나에게 마음을 열었고, 나도 이 도도한 생명체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갔다.
고양이의 매력은, 억지로 다가오지 않는 데 있다. 강아지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면, 고양이는 마치 '너, 오늘은 좀 괜찮네' 하며 선택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 그게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그 하루하루의 작은 진전이 더 크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내 무릎에 올라왔던 날. 아무 일도 아닌 듯 자연스럽게 앉았지만, 나 혼자 속으로 눈물 나게 감동받았던 기억이 있다.
루루는 말을 하지 않지만, 묘하게 내 기분을 잘 읽는다. 퇴근 후 지쳐서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내 다리 옆에 와서 가만히 누워 있는다. 같이 자는 건 여전히 싫어하지만, 내가 잠들기 전까지 내 발밑 근처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든든할 수 없다.
그리고 고양이는 정말 웃기다. 고양이 밈이 왜 유행하는지, 고양이를 키워보면 바로 안다. 박스에 들어가 혼자 신나서 놀고,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공중 점프를 하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벽을 쳐다보며 야옹야옹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정줄 놓고 웃게 된다. 내 방의 모든 가구는 이제 루루의 놀이터가 되었고, 나는 그걸 감상하는 '관객 1인'처럼 살고 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은 조용하면서도 깊다. 강아지처럼 매일 산책을 하진 않지만, 하루의 흐름을 함께 만든다. 아침엔 내 알람보다 먼저 나를 깨우고, 밤엔 내가 불 끄고 침대에 누우면 슬그머니 자기 자리로 간다. 언뜻 보면 각자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미묘하게 서로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루루 없는 삶이 상상이 안 간다. 고양이는 나에게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외로운 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줬다. 텅 빈 집에 돌아와도 나를 기다리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된다.
요즘은 어릴 적 내가 왜 고양이를 그리 오해했을까 싶다. 도도함 속에 감춰진 따뜻함,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누구보다 사람 곁에 있고 싶은 마음. 그런 고양이의 매력을 이제야 알아챈 나 자신이 조금 웃기기도 하고, 동시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샌디에이고의 해 질 무렵, 창밖으로 주황빛 햇살이 들어올 때, 루루는 늘 그 빛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다 내가 부르면 귀만 살짝 움직이고, 가끔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본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세상의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걸 느낀다.
고양이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나처럼, 어릴 땐 몰랐지만 이제는 완전히 고양이에 빠져버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루루는 내 집이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진짜 '내 공간'이 되게 해준 존재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따뜻한 눈빛 하나에 또 하루를 위로받는다.


 멜론기상캐스터
멜론기상캐스터
 인디애나YO
인디애나YO
 핫도그무브먼트
핫도그무브먼트
 감귤도넛사냥꾼
감귤도넛사냥꾼



 대박전자제품 CNET |
대박전자제품 CNET | 
 신바람 이박사 블로그 |
신바람 이박사 블로그 | 
 뉴저지에 살리라 blog |
뉴저지에 살리라 blo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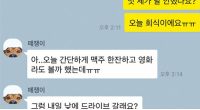
 패스트앤큐리어스 BLOG |
패스트앤큐리어스 BLOG | 
 영화를 사랑하는 돌리돌이 |
영화를 사랑하는 돌리돌이 | 
 Duck Duck Go |
Duck Duck Go | 
 Pinky Seven |
Pinky Seven | 

 미국 기상청 뉴우스 |
미국 기상청 뉴우스 | 
 카리나별이나 블로그 |
카리나별이나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