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샌프란시스코 하늘은 파랗고 길거리는 시원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내가 일하는 사무실 분위기는 다르다.
우리회사는 헬스케어 보험회사이다보니 매일 환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다루고 청구를 검토하지만, 정작 우리 직원들의 정신건강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EAP같은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그런 건 없다.
휴가를 내서 병원을 가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상사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런데 옆자리 스티브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툭 던졌다.
"나 요즘 정신상담 받고 있어. 내 돈 내면서."
스티브는 평소에 말수가 적지만 묵묵히 일을 잘하는 타입이라 번아웃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매일 반복되는 클레임 처리와 숫자 보고, 고객 불만 대응 속에서 점점 무기력해 지다보니 한계가 왔다고 했다.
흥미로웠던 건 스티브가 받는 상담이 꼭 오프라인 병원만은 아니라는 거였다.
처음에는 실제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받다가, 요즘엔 AI 앱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챗봇이랑 무슨 상담을 해?" 하고 웃었더니, 스티브는 진지하게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아. 그냥 얘기하면 AI가 내 감정을 분석해 주고 스트레스 패턴까지 알려준다니까."
그는 'Wysa' 같은 AI 기반 멘탈 헬스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루에 10분만 대화를 나누면, 내가 요즘 많이 쓰는 부정적인 단어, 기분이 꺾이는 시간대,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파악해 준다고 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실제 인간 상담사 연결도 해주는데, 이게 전화보다 부담이 적어서 더 편하다고 했다.
"사람한테 얘기할 땐 괜히 눈치 보이잖아. 근데 AI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주니까 마음이 풀려."
듣고 보니 이해가 갔다. 요즘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업무량 때문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팀원이나 상사에게 말하면 평가에 영향이 갈 것 같고, 가족에게 말하면 괜히 걱정만 줄 것 같으니까.
그럴 땐, 그냥 내 이야기를 전부 들어주는 익명의 존재, 그게 AI든 상담사든가 필요하다.
나도 그날 밤, 호기심에 AI 상담 앱을 깔아봤다. "오늘 하루 어땠나요?"라는 메시지에 '지쳤다'고 입력하니, 앱이 이렇게 답했다.
"지쳤다는 건 오늘 하루를 버텨냈다는 뜻이에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실래요?"
그 순간, 내가 사람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 이런 거였다는 걸 깨달았다. 평가도, 잔소리도, 해결책 강요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말.
물론 AI 상담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는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데는 꽤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스티브는 "밤 2시에 상담사 전화는 못 하지만, AI랑은 그게 된다"라며 웃었다.
회사에서 아무 지원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 이런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건 어쩌면 생존 본능일지도 모른다.
헬스케어 보험회사의 책상 앞에서, 나는 오늘도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동시에 깨닫는다.
진짜 헬스케어는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걸.
어쩌면 언젠가는 회사가 성과 지표만큼이나 직원들의 멘탈 지표를 중요하게 보고, AI 상담 앱 구독료를 복지로 제공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각자 핸드폰 속 작은 상담사와 함께 버텨야 한다.


 콘푸라이트선생님
콘푸라이트선생님
 언더태희꺼
언더태희꺼
 많이화나그란데
많이화나그란데





 대박전자제품 CNET |
대박전자제품 CNET | 
 신바람 이박사 블로그 |
신바람 이박사 블로그 | 
 뉴저지에 살리라 blog |
뉴저지에 살리라 blog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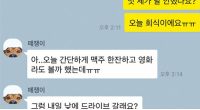
 패스트앤큐리어스 BLOG |
패스트앤큐리어스 BLOG | 
 영화를 사랑하는 돌리돌이 |
영화를 사랑하는 돌리돌이 |  Wicked - Fireyo |
Wicked - Fireyo | 
 누추한탐방 BLOG |
누추한탐방 BLOG | 

 my town K blog |
my town K 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