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무현장에서 보고 듣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특히 요즘은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미국의 상속세 제도를 비교하다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부터 올립니다. 마치 오르면 도둑질한 것처럼 벌을 주죠. 종부세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가구 1주택자라도 공시가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중과세를 맞고, 특히 다주택자는 세금 폭탄에 가까운 과세를 받습니다. 정부는 이를 '부의 재분배'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투기억제를 세금으로 대신하려는 땜질처방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정치적 바람 따라 바뀌니 예측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요.
반면 미국은 어떨까요? 상속세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가 무려 1인당 1,320만 달러(2024년 기준)입니다.
부부 합산하면 약 2,640만 달러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350억 원까지는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한도 축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미 그 틈을 이용해 신탁을 세우고, 증여 스케줄을 조정한 고소득층들은 대응 다 끝냈습니다. 반면 중산층 이하는 변호사 고용해서 자신들의 유언장 하나 쓰기도 벅찬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세금 보고에 시간을 다 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어가면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세회피처(Tax Haven)라고 불리는 지역들—케이맨 군도, 버뮤다, 파나마,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은 전 세계 상위 0.01%의 돈세탁 세탁소이자 법인세 피난처입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수십 조의 수익을 이런 지역에 법인을 세워 세금 몇 푼 내고 끝냅니다. 이런 걸 '합법적인 절세'라고 부르죠. 세무조사라도 들어가면, 회계법인들과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이건 국제법상 정당합니다"라며 방어해줍니다. 세금 정의는 법조항 뒤에 묻히고, 평범한 사람들은 그 법조차 이해할 시간도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서민입니다. 월급 받을 때는 4대 보험과 소득세가 자동 공제되고, 집 한 채 있어도 보유세, 종부세, 취득세가 줄줄이 따라옵니다. 자식 하나 대학 보내려면 등록금에 간접세까지 다 얹어 내야 하죠.
그 와중에 "공정 사회를 위해 세금을 냅시다"라는 캠페인성 슬로건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섬나라 페이퍼컴퍼니 뒤에 숨고, 누군가는 집값 오른 죄로 세금 걱정에 잠을 설치니까요.
이쯤 되면 세금이 단순한 공공재원 조달 수단인지, 아니면 체제에 대한 복종의 척도인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세금을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서워서'입니다. 세금 안 내면 압류, 체납, 형사처벌이 따라오니까요.
반면 고자산가는 어떻게든 안 내려고 '플래닝'을 하죠. 플래닝이라는 포장이 씌워진 회피입니다. 자, 누구의 인생이 합리적이고 누구의 인생이 정직할까요?
결국, 세금은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력과 자산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세금을 내는 건 바보'라고 생각하죠. 웃긴 건, 두 부류 다 국가에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전자는 국가 재정의 기반이고, 후자는 법과 제도의 구멍을 연구해주는 실험대상이니까요.
이 시스템 안에서 공정함을 말하는 건 아이러니일지도 모릅니다.
세금은 결국 이 사회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개 서민만이 비춰질 뿐, 진짜 큰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절세를 배우기도 벅찬 서민들에게 조세회피처(Tax Haven)는 그림의 떡이되고 마는 현실입니다.


 바실라댁
바실라댁  닮은살걀USA
닮은살걀USA  스벅빽다방
스벅빽다방  고칼로리귀신
고칼로리귀신  태정태세문단속
태정태세문단속  미국TODAY
미국TODAY 
 미국 항공사 마일리지
미국 항공사 마일리지 
 미국 모든 지역 정보
미국 모든 지역 정보
 PETRO 바티칸 성지
PETRO 바티칸 성지 
 집에서 즐기는 삼바
집에서 즐기는 삼바 
 자동차의 모든이야기
자동차의 모든이야기
 캘리포니아 Kangaroo
캘리포니아 Kangaroo
 미국 기상청 뉴우스
미국 기상청 뉴우스
 동쪽나라 제임스엄마
동쪽나라 제임스엄마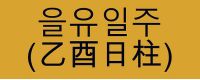
 부드러운 느낌 그 느낌
부드러운 느낌 그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