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1994년, 나이 서른에 미국 땅을 밟았소.
영어는 "헬로우", "쏘리", "오케이" 딱 세 마디뿐이었지만, 그걸로 뉴욕 퀸즈에서 옷가게 두 개를 30년 가까이 운영했지.
처음 가게 문 열었을 때, 진열대도 허술했고, 간판은 친구가 페인트로 직접 써준 거였어요.
그때는 물건보다 내 얼굴로 장사했소. 영어 몰라도 웃으면 통하더이다.
손님이 들어오면 "헬로우~" 하면서 환하게 맞았지.
손가락으로 셔츠 가리키며 "굿 프라이스~" 하면 대충 감 잡고 사고, 월급받을때마다 자주오니까 깎아달라며 흥정하는 단골손님도 있었소.
그중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라는 흑인 중년 남자였는데,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꼭 와서 남방이나 티셔츠 3-4장씩 사갔소. "여기 옷이 제일 편해" 하면서 매번 웃으며 계산하고 갔지.
물론 좋은 기억만 있었던 건 아니오.강도를 세 번이나 당했소.
첫 번째는 1995년, 가게 문 닫을 무렵이었어요. 모자 눌러쓴 청년이 들어오더니, 총을 꺼내들며 돈 내놓으라 하더이다. 그때는 겁도 없었는지, "No money!" 소리치고 바로 경찰 불렀소. 다행히 달아났지.
두 번째는 2007년. 가게에 혼자 있던 날이었어요. 이번엔 칼들고 들어온 강도 2명이었소. 계산대 돈 다 털리고... 며칠은 잠도 못 잤지.
세 번째는 2016년. 새벽 배송 받느라 일찍 나갔는데, 차 안에서 돈봉투 들고 나오다가 털렸소. 그때부터는 늘 뒷주머니에 스프레이 하나 들고 다녔지.
그래도 나는 가게 문을 닫지 않았소.
그게 내 일터고, 내 인생이니까.
가게 두 개로 아이 셋 대학까지 다 보냈고, 아내랑 하루도 쉬지 않고 같이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자식들 책상 놓아줄 공간 만든 게 가장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3년 전부터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소.
인터넷으로 옷 사고, SNS 보고 쇼핑하는 시대라지.
2023년 여름에 결국 가게 문 닫았어요.
간판 떼며 혼자 말했소.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지금은 뭐하고 사느냐고?
아이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아요.
큰아들은 사업하고, 둘째는 회계사. "아빠 이제 좀 쉬세요" 하며 카드도 줬는데...
그게 그렇게 뭉클할 수가 없더이다.
요즘도 아침 일찍 눈 떠요.
몸이 기억하는 거지.
커피 한 잔 들고 창밖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속으로 "헬로우~" 인사하게 돼요.
내 인생? 헬로우 하나로 충분했소.
그걸로 아이 셋 키우고, 사람들과 웃고, 또 울었으니 말이오.


 이트타운정보
이트타운정보
 미국TODAY
미국TODAY
 하와이순두부
하와이순두부
 어부와낚시
어부와낚시



 마스크를 쓴 미국남자 |
마스크를 쓴 미국남자 | 
 미국 지역 정보 로컬 뉴스 |
미국 지역 정보 로컬 뉴스 | 
 투자정보 뉴스 업데이트 |
투자정보 뉴스 업데이트 | 
 미국 부동산 정보의 모든것 |
미국 부동산 정보의 모든것 | 
 낙지짬뽕 스핀 킬러 |
낙지짬뽕 스핀 킬러 | 
 칠리 Boy Club |
칠리 Boy Club | 
 오픈 플렉스 마인드 |
오픈 플렉스 마인드 | 
 Why Not Me |
Why Not M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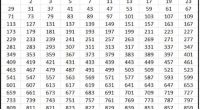
 센 강에서의 관광 크루즈 |
센 강에서의 관광 크루즈 | 